경상남도 함양에는 유서깊은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에 기댄 정자도 유명한데 동호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함양이라고 하지만 조선시대 안의현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이곳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정조가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을 현감으로 보낸 것이다. 젊은 시절 친우의 억울한 죽음으로 과거의 뜻을 접고 백탑파라고 불릴 정도로 백탑, 원각사지십층석탑 주변에서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서얼 친우들과 신분을 넘어 학문을 탐독하였다.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세계사적 조류를 읽었던 것이고 이들의 학문 경향을 과거 중상학파라고 하였지만 정확히는 이용후생학파라고 한다.
'나라에서 가장 볼만한 장관이 광활한 영토나 아름다운 산수 혹은 화려한 누각이나 거대 한 성곽이 아니라 '깨어진 기와조각과 똥 부스러기이다'
'이용(利用)이 있은 다음에야 후생(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다음에야 올바른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용이 되지 않으면서 후생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무니, 생활이 이미 제각기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겠는가.'
박지원, 『열하일기』 '도강록' 중에서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적 경향 중에 근현대 사회변혁에 가장 가까운 학문적 경향이다.
그런 박지원이 몸을 일으켜 나아간 곳이 멀리 지금은 함양이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땅 안의현이다. 이곳에서 연암은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모두 실천하기에 이른다. 그 상징물이 바로 물레방아다. 편의성도 있고 무엇보다 민생을 돌본 것이다. 또한 북경사신으로 갔던 경험을 '열하일기'라는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지었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흙집이라 불편하게 사는데 청나라는 벽돌집을 짓고 실용적으로 산다고 부러워 했는데 바로 이 안의현에서 청나라의 벽돌 기술을 받아들인 벽돌집을 지었다. 입으로 만 살던 시대 입에서만 그치지 않은 실천적 지식인의 모본이었다.
그런 박지원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문체반정의 대표적 문인 이옥이다.
박후가 말하였다.
"내가 집을 지으니,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말하길, '중국식으로 지으면 비방이 클 것이다’
라고 하였다.(侯曰 我作室家, 人聞之者曰 ‘華之制, 其嗔大)"
이옥, 이옥전집 1, 옥변, 『남정십편』 267쪽
박후는 연암 박지원이다.
조선의 자유인 문장가 이옥 유허 및 마산포
그러나 네 체질이 비록 미물이나 또한 하늘이 낳은 것이고 소리가 비록 울음 네게서 나오지만 하늘이 실은 ...
blog.naver.com
옛날에는 정여창 고택으로 흔히 알려졌는데 지금은 일두고택으로 부르고 있다.
아마도 이름을 피휘하고 호로써 이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여창 고택의 상징은 솟을대문에 많은 정려와 그것을 열고 들어서면 나오는 사랑채 벽면에 걸린 큰 휘호 '충효절의'다. 정여창 일족은 조선 전기 훈구파 정인지 일가로 거족인데 정여창은 물론 아버지 정육과 더불어 김종직을 사사한 사림의 길을 걸은 조선 사림의 큰 스승이다. 연산군의 스승이었으나 결국 스승 김종직이 연루된 무오사화에 멀리 북관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병사했다.
함양동호정은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몽진을 호종한 동호 장만리를 공을 기려 9대손 가선대부오위장을 지낸 장재헌이 1895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동호정은 함양군 안의면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전주방향으로 7km 정도의 거리에 국도와 연접하여 위치한다. 특히 남강천 빼어난 절경의 화림동 계곡의 정자들 중 가장 크고 화려하다.
함양 용추사는 장수사(長水寺)를 잇는 사찰이다.
장수사는 일주문 북쪽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다. 현재의 용추사(龍湫寺)는 북쪽으로 약 400m가량 떨어진 용추폭포 근처의 용추암(龍湫庵) 터에 1959년 중건되었다. 빛바랜 단청과 울퉁불퉁한 자연목을 그대로 쓴 일주문은 함양 용추계곡 일대에 옛 장수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로 1711년(숙종 37)에 건립되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장수사가 화재로 모든 전각이 소실될 때 유일하게 화를 면했다. 일주문 정면 창방에는 ‘덕유산장수사조계문(德裕山長水寺曹溪門)’이라 쓴 현판이 걸려있다.
함양 용추사 일주문은 단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서까래와 부연으로 구성한 겹처마 구조이다. 정면 평방에 7개 공포, 전체 20개 공포를 올린 다포식 공포 구조이다. 기둥은 주기둥 옆에 부재를 X자형으로 보강하여 지붕을 지지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용추사 일주문은 건립연대가 명확하고, 공포의 형식이 조선중기의 형식미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형식에서도 팔작지붕을 한 일주문은 정면기준 주로 5개 공포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이 일주문은 7개 공포로 매우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은 1737년(영조 13)에 태어나서 1805년(순조 S)에 69세를 일기로 타계한 조선후기 실학자이다. 호는 반남이며, 자는 미중 또는 중미, 호는 연암 또는 연상, 열상외사이다. 그의 집안인 반남 박씨 가문은 영조 당시 노론측의 일원으로 명문거족이었다.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박지원은 벼슬길을 멀리한 부친 박사유 보다 지돈녕부사라는 고위 벼슬을 지낸 조부 박필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서울의 서쪽인 반송방 야동에서 출생한 박지원은 과거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학문과 저술 에만 전념하였다. 1768년 백탑 근처로 이사하면서 박제가•이서구•서수•유득공•유금 등과 학문적으 로 깊은 교유를 가졌다. 이 무렵 홍대용 •이덕무• 정철 등과 자주 만나 토론했으며, 유득공• 이덕무와는 서부 지방을 여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홍국영이 정권을 잡아 위세를 떨치자 벽파였던 박지원은 생명 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다. 1778년 결국 송도(개성)에서 삼십 리 쯤 떨어진 황해도 금천소의 외진 골짜기 연암'으로 은거했는데 그의 호가 연암으로 불려 진 것도 이에 연유한다. 1780년 홍국영이 실각하자 박지원은 정치적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은 청나라에 가는 기회를 맞았다. 팔촌형이자 영조의 사위인 박명원이 청나라 전공제의 고화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사행단의 정사로 임명된 것이다. 박지원은 박명원의 권유에 따라 개인 수행원에 해당하는 자제군관 자격으로 숙원이던 중국 여행을 떠났다.
박지워은 1780년(정조 4) 6월 25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보고 들은 이때의 견문을 정리하여 쓴 것이 조선의 베스트셀러 『열하일기』이다.
실학박물관, 2015, 『북학파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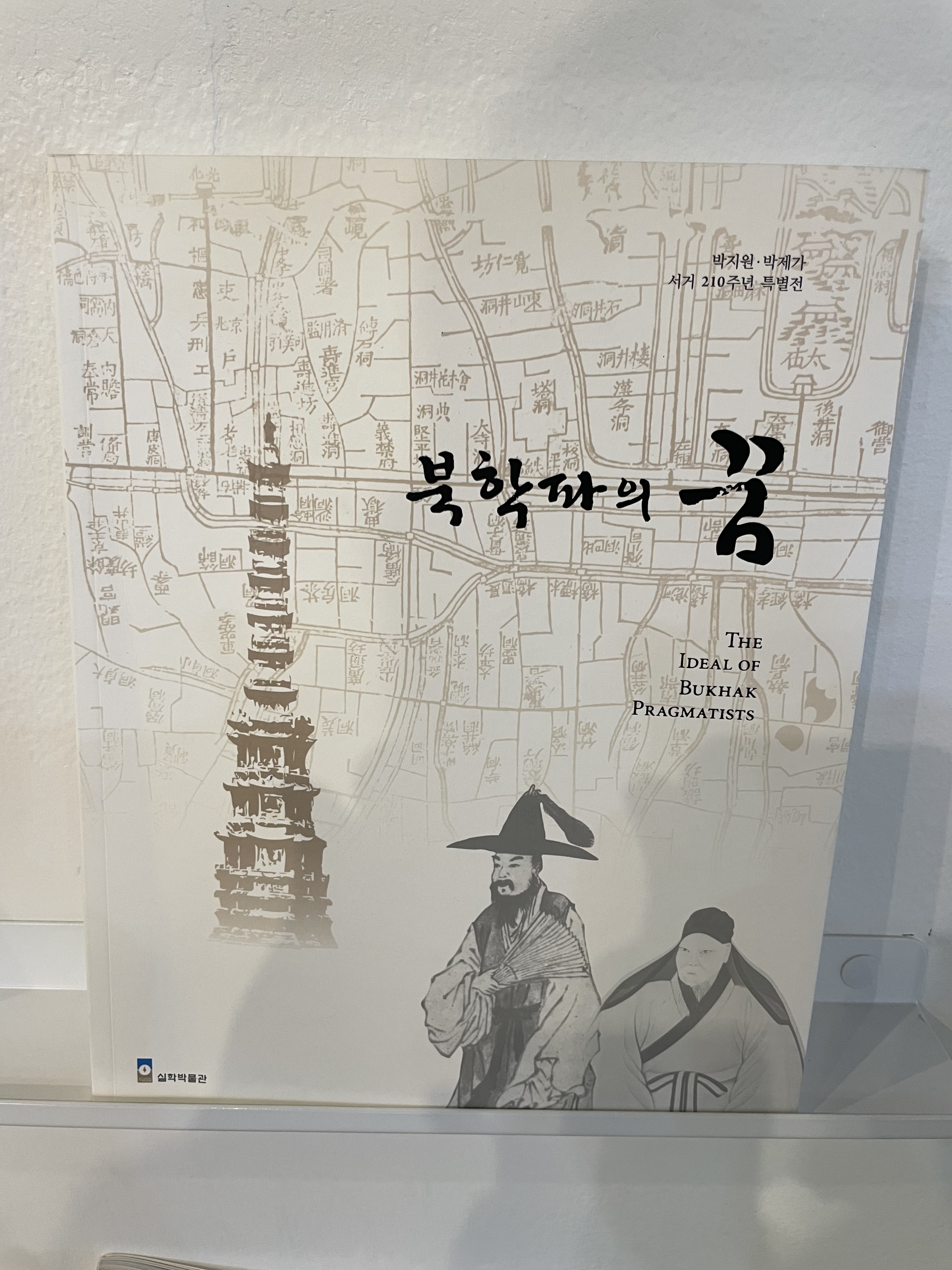















2013.8.9.
'달이샘의 역사나들이(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유수호평화박물관 (0) | 2025.06.09 |
|---|---|
| 영월 청령포 장릉 (1) | 2025.06.07 |
| 충주 탄금대 그리고 문경새재 (1) | 2025.06.05 |
| 합천 해인사 고령 지산동고분군 장기리 암각화 (1) | 2025.06.04 |
| 김해 금관가야 (4) |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