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곽 문화의 정수인 수원화성의 탄생은 제22대 정조(1752탄생 재위1776-1800)가 아버지 사도세자(1735-1762)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恨)과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사방으로 통하는 위치에 있는 수원을 상업 활동이 활발한 경제 신도시로의 건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였다.

화성을 축조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역모로 몰아 죽이고 영조 즉위부터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붕당 서인 노론이 집권하고 있었다. 영조 즉위 이래 강력한 왕권강화책으로 탕평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강력한 기득권을 누리던 노론은 자신들이 죽인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 이성(李祘정조의 이름인 祘이 한자독음법에 따라 '산'으로 널리 읽히어 그간 정조의 이름을 '산'으로 불렀으나 정조가 지시하여 편찬한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에 따르면 정조가 자신의 이름을 훈민정음으로 '셩'이라고 쓰고 있어 당시 중세국어의 '셩'발음이 지금 '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산'이 아닌 '성'으로 부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밖에 당대 기록들 역시 '산'이 아닌 '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조의 이름은 한자는 '祘'이 같으나 정조이름으로 부를 땐 '성'으로 불러야 한다.)의 즉위를 강력히 막고자 하였다.
이는 연산군 때 어머니 폐비 윤씨의 사건 이후 많은 신료들이 죽었던 갑자사화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노론 대신들의 강력한 의지였고 그에 따라 세손 이성의 즉위는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뿐만 아니라 세손 시절 및 즉위 초까지도 정조는 끊임없이 노론 대신의 견제와 암살 위협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정사를 돌보았다.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등극한 정조는 즉위부터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寡人思悼世子之子也)”
빈전(殯殿) 문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였다. 윤음을 내리기를,
"아! 과인은 사도 세자(思悼世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 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아! 전일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不貳本]’에 관한 나의 뜻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향사(饗祀)하는 절차는 마땅히 대부(大夫)로서 제사하는 예법에 따라야 하고, 태묘(太廟)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혜경궁(惠慶宮)께도 또한 마땅히 경외(京外)에서 공물을 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나 대비(大妃)와 동등하게 할 수는 없으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대신들과 의논해서 절목을 강정(講定)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괴귀(怪鬼)와 같은 불령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써 논죄하고 선왕의 영령(英靈)께도 고하겠다."
하였다.
(召見大臣于殯殿門外。 下綸音曰: "嗚呼! 寡人思悼世子之子也。 先大王爲宗統之重, 命予嗣孝章世子, 嗚呼! 前日上章於先大王者, 大可見不貳本之予意也。 禮雖不可不嚴, 情亦不可不伸, 饗祀之節, 宜從祭以大夫之禮, 而不可與太廟同。 惠慶宮亦當有京外貢獻之儀, 不可與大妃等, 其令所司, 議于大臣, 講定節目以聞。 旣下此敎, 怪鬼不逞之徒, 藉此而有追崇之論, 則先大王遺敎在焉, 當以當律論, 以告先王之靈。")
정조실록1권, 정조 즉위년(1776) 3월 10일 신사 4번째기사
빈전 문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고 사도 세자에 관한 명을 내리다
라고 천명하며 아버지에 대한 복권(장헌세자로 추존되고 고종 때 장조로 추존)과 노론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한 왕권강화를 천명하며 개혁에 착수 하였고 그 개혁의 상징적 의미와 효과는 바로 ‘화성’으로 집약되었다.
화성의 명칭 유래에 대해서는 수원의 읍치는 원래 지금의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화산(花山)에 있었는데, 정조가 현륭원(융건릉)을 조성하면서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읍치를 옮기면서 새로 지은 성의 이름을 읍치가 있던 화산에서 따와 '화성(華城)'으로 하고, 수원도호부도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화산에는 아직도 수원 고읍성(水原古邑城)이라는 흔적이 남아있다. 즉, 화성은 정조가 현륭원이 있는 화산의 '화(花)'자와 통용될 수 있는 '화(華)'를 써서 화성이라고 한 것으로 <장자>의 ‘천지’편에 나오는 고사 '화인축성(華人祝聖)'이라는 고사에서 따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화(華)라는 지방의 제후가 요(堯) 임금에게 부귀, 장수, 다산을 기원했다는 의미로 정조는 이를 ‘백성은 왕실의 안녕을, 임금은 백성의 번영을 기원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뜻으로 이어받아 화성이란 이름으로 지은 것이다.
상이 높은 곳에 올라 고을터를 바라보고 곁에 모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본디 허허벌판으로 인가가 겨우 5, 6호였었는데 지금은 1천여 호나 되는 민가가 즐비하게 찼구나. 몇 년이 안 되어 어느덧 하나의 큰 도회지가 되었으니 지리(地理)의 흥성함이 절로 그 시기가 있는 모양이다."
하였다. 인하여 팔달산(八達山)에 올라 성 쌓을 터를 두루 살펴보고 상이 이르기를,
"이곳은 산꼭대기의 가장 높은 곳을 골라 잡았으니 먼 곳을 살피기에 편리하다. 기세가 웅장하고 탁트였으니 하늘과 땅이 만들어낸 장대(將臺)라고 이를 만하다. 지금 깃발을 꽂아놓은 곳을 보니 성 쌓을 범위를 대략 알겠으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인가를 철거하자는 의논은 좋은 계책이 아닌 것같다.
현륭원이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부(府)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화(花)자와 화(華)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그렇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꽃송이와 같다 하여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하여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천(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들어맞지 않겠는가."
하였다. (癸卯/上登覽邑基, 謂左右曰: "此地本是空曠大野, 人家僅爲五六戶, 而今則千餘民戶, 屋舍櫛比, 不出數年, 居然一大都會。 地理之興旺, 自有其時矣。" 仍登八達山, 周覽築城基址。 上曰: "此地占得山頂最高處, 便於瞭望。 氣勢雄爽, 可謂天造地設之將臺矣。 今見揷旗處, 則築城範圍, 可以領略, 而至於北里人家毁撤之論, 終非計之得者。 園所, 花山也; 此府, 柳川也。 取華人祝聖之意, 名此城曰華城, 花與華通。 花山之義, 蓋以八百峰巒, 拱護一岡, 圓正如花瓣之謂也。 然則柳川之城, 南北稍長如柳葉, 則實有意義矣。 昨以華城、柳川之義, 已有諭及於領府事者, 而此城挾而長, 旣似柳葉, 則於北角人家相錯處, 三曲折以象川字, 豈不尤襯於柳川耶?。")
정조실록39권, 정조 18년(1794) 1월 15일 계묘 1번째기사
수원성 축조에 대해 하명하다
여하튼 화성의 공식 명칭은 '화성'이지만 수원에 있는 성이므로 조선 시대부터 일명 '수원성'으로도 불렸는데, 1935년 조선총독부가 고시 제318호로 화성을 '고적 제14호 수원성곽'으로 등록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문화재 분류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화성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 '수원성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화성 이름을 되찾아주자는 운동(수원시장 심재덕이 화성 복원과 행궁 복원에 열심히 하며, 한신대 유봉학 교수 등의 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였다.)이 일어나 마침내 1996년에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40호로 '화성'이라는 공식 명칭을 찾았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지역명과 동시에 붙은 ‘수원 화성’을 공식화 하였다.

정조13년(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 아래 영우원(永祐園)에서 경기도 화성시 화산 아래 옛 수원(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및 와우리 일대)으로 옮겨 현륭원(顯隆園)으로 개칭하여 조성하고 본래 수원 읍치를 지금의 팔달산 아래 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집값과 이사비용을 국고로 지불하며 갑작스런 이주로 민생이 동요하는 것을 현명하게 처리하여 기존의 봉건적 전통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을 봉건국가가 부담하는 등 당시의 파격적인 정책을 단행하였다.
지금의 융건릉이 조성되기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정조 이전까지 수원부의 중심으로 인근에는 고려 때 쌓은 토성인 수원 고읍성(경기도 기념물 제93호)이 남아있다. 수원읍성의 둘레는 최대 1,320m이내의 규모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수원부에서 편찬한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의 기록에는 800~900m에 이른다. 다만 수원읍성은 영조 이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승전으로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하게 된 독성산성(세마대)이 수축되면서 사실상 방어적 수성의 쓰임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당대 수원부 관아의 규모는 현륭원 공역 당시의 기록인 『원소정례(園所定例)』에 내아 14칸 등 모두 163.5칸에 이른다. 지방 관아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컸다. 뿐만 아니라 주변 민가의 규모는 현종 때 효종 능 선정과정에서 능지로 쓸 경우 민가가 5백채, 1785년의 『수원부읍지』의 885호와 1789년 현륭원 천봉과정에서 작성된 『수원부지령등록(수원부하지초록)』 698호, 『호구총수』670호를 통해 대략 600호 이상이 밀집하여 살았다.
이병권, 화성시 황계 마을의 어제와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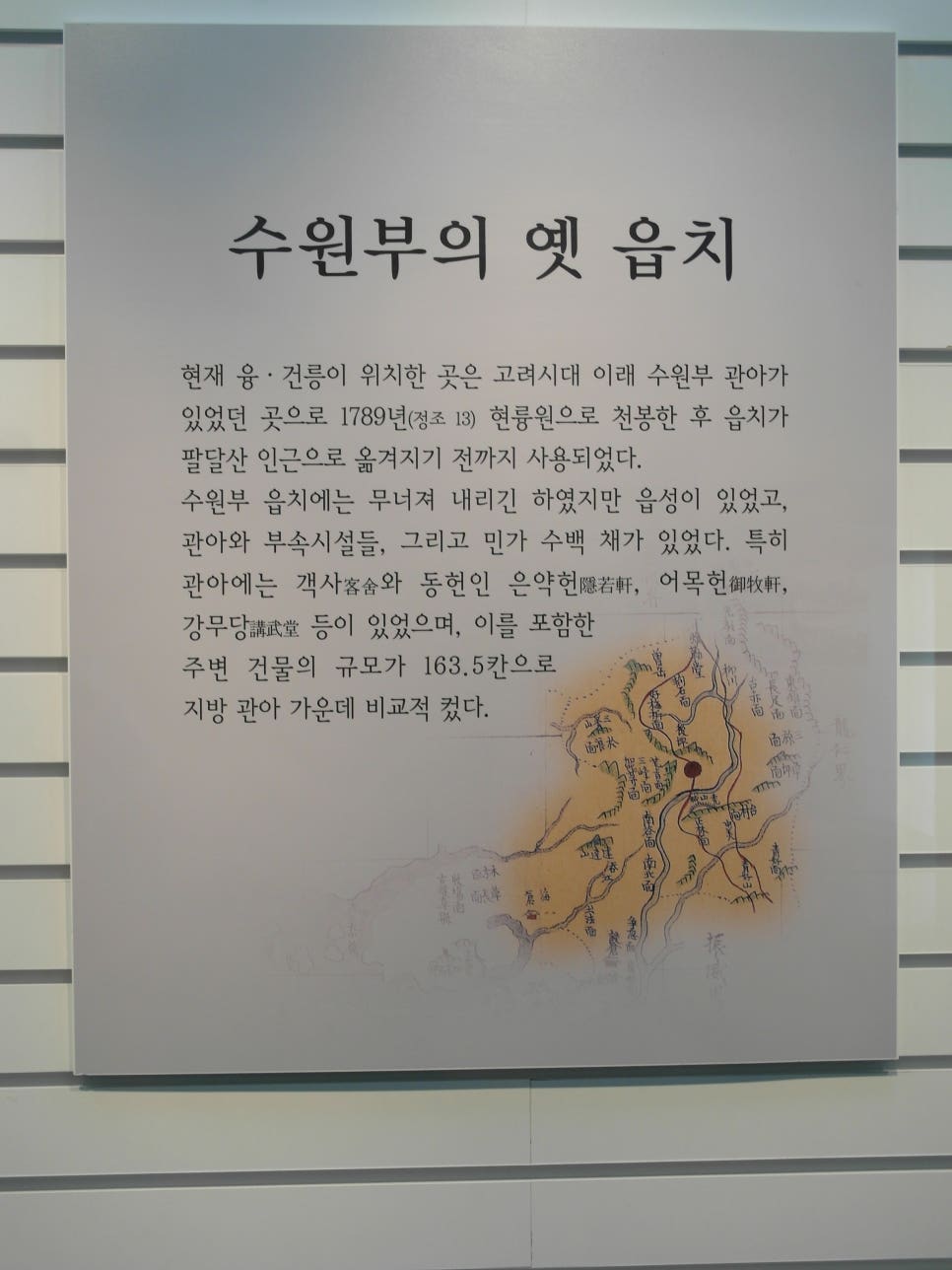

화성 축성은 반계 유형원(1622-1673)과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설계하고 축성 감독에는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1720-1799)이 담당했다. 18세기 조선의 최첨단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의 집합체인 화성은 우리나라의 성곽, 중국, 그리고 서양의 성곽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성의 둘레와 높이 성벽의 규모와 성벽을 쌓을 재료를 정하고 전국에서 유능한 장인들을 불러 모아 축성하였다. 이때 참여한 장인과 일꾼에게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작업 능률을 높이고 아울러 성벽과 성문 등을 축조하는데 담당한 관리와 장인을 명시하여 일종의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등 근대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식 성곽의 방식을 차용하여 벽돌이란 새로운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성이 가지는 다양한 방어시설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당시 화포를 통한 전쟁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현대 포격전을 대비하여 축성이 이루어졌다.
당시 벽돌이란 소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1393년 개성부 내성이 벽돌로 지어졌는데 본래 1/3로 지을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컸다. 성종 때는 용강, 의주, 벽산, 안주 등 함경도 지역에 벽돌로 축성을 하였는데 제한적이었다. 이는 벽돌 제작에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제작 기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378년 배극렴은 합포영을 벽돌로 축성하려다 비용이 커지자 석성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가 되면 아래와 같이 벽돌의 쓰임과 우수성, 그리고 중국에서 벽돌을 굽는 가마기술을 받아 들여 1742년(영 조 18년) 강화외성, 1779년(정조 3년) 남한산성의 여장(☆1품, 성벽 위에 낮게 쌓 은 담), 그리고 수원화성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벽돌의 장점에 대해서 열거한 박지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집은 오로지 벽돌에만 의존해서 짓는다. 벽돌이란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말한다. 길이는 한 자, 폭은 다 섯 치이고, 가지런히 포개면 네모반듯하고 두께는 두 치이다. 하나의 틀에서 찍어 내지만, 벽돌귀가 떨어진 것, 모서리가 닳아빠진 것, 몸체가 흰 것 등은 꺼려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틀에서 찍어 낸 벽돌이라 도 들쭉날쭉할까 걱정이 되어 반드시 자로 재어 보고, 이상이 있는 놈은 자귀로 깎고 돌로 갈아 힘써 가지런하게 만드니 만 장의 벽돌이라도 모양이 일정하다." 86쪽
"요컨데 집을 짓는 데는 벽돌을 쓰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집이 벽에 기대어 위는 가볍고 아래는 완전하며, 기둥은 담장 속에 들어 있어 풍우를 겪지 않는다. 그리하여 불이 번질 것을 겁낼 것도 없고, 좀도둑이 담을 뚫 는 것을 겁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참새. 쥐, , 고양이의 염려가 근절된다." 90쪽
"자네가 모르는 것일세. 우리나라 성 쌓는 제도가 벽돌을 쓰기 않고 돌을 쓰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닐세, 대 저 벽돌이란 하나의 틀에서 찍어 낸즉 만 개의 벽돌이라도 모양이 같으니 다시 힘 들여 갈고 쪼는 공을 들일 필요도 없고, 가마 하나를 구워 놓으면 수많은 벽돌을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으니 다시 인부를 모집해 벽돌을 옮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네."(정진사에게) 98쪽
"지금 저 돌을 산에서 쪼개어 내려면 몇 명의 석수장이를 마땅히 써야 할 것이며, 수레로 옮기려면 몇 명의 인 부를 써야 하며, 이미 옮긴 뒤에도 또 몇 명의 장인바치들을 동원해서 쪼고 다듬을 것인가? 또 쪼고 다듬는 공력은 또다시 몇 일이나 허비할 것이며 쌓을 때도 돌 하나를 놓는 공력에 또 몇 명의 인부를 써야 하는가?"98쪽
"벽돌 하나의 견고함은 돌만 같지 못하지만 돌 하나의 견고함은 한 만 개의 벽돌이 아교처럼 붙은 것에는 따라갈 수 없는 걸세. 이것이 벽돌과 돌의 이롭고 해로움과 편리함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까닭이네.(박제가에게)" 100쪽
박지원, 역주 김형조, 2017,열하일기 1, 돌베개

뿐만 아니라 자재를 운반하는 수레와 하중이 많이 나가는 석재 등을 들어 올리는 오늘날 기중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중기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고안 되어 사용됨으로써 2년 반(1794~1796)이라는 짧은 시간에 튼튼한 성곽을 쌓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원 화성이 축성되는 당시 학문적 배경에는 성리학에서 불거진 진경문화를 바탕으로 실용성과 사회개혁적인 실학이 탐구되었으며 이러한 문화적 바탕으로 축성된 화성의 특징을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롭고 튼튼한 성곽으로서 산성에 의존하던 종래 방식에서 벗어나 평지성으로 지었다는 점과 다른 성곽에는 없는 새로운 방어 시설들을 설치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화성은 팔달산이라는 주산을 뒤로하고 그 아래 행궁과 화성유수부의 건물을 배치하니 자연히 동향으로 배치되어 그 앞 직각 방향으로 간선 도로가 남북 방향으로 놓이게 되어 북문인 장안문과 남문인 팔달문이 서울을 잇는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교통 중심지가 되어 큰 시장이 이루어졌다.

산성과 평지성의 모습을 두루 갖춰져 있는 화성 성곽의 총 둘레는 약 5.7㎞, 성벽의 높이는 평균 5m 이고 그 위에는 높이 1.2m 정도의 여장을 쌓았다. 여장에는 여러 개의 총구를 규칙적으로 뚫어놓았다. 성벽의 기반은 돌과 모래로 다진 뒤 그 위에 배흘림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쌓았다.

화성에는 네 군데 성문을 내었는데 북문을 장안문, 남문을 팔달문, 서문을 화서문, 동문을 창룡문이라고 지었고 성문에는 각기 옹성을 쌓아 성문을 방어했다. 특히 장안문과 팔달문 양 옆에는 적대를 쌓아 성문을 방어하였다. 또한 장안문과 팔달문을 좌우대칭으로 주작대로를 내었으며 중요 방어시설로 대문 위에 누조 2기를 설치하여 적이 성문을 태우려고 할 때 물을 흘려 화공을 막고 아울러 옹성 문 위에 오성지를 내어 적이 문을 부수려 할 때 끓는 물이나 기름을 부어 적을 차단하였다. 또한 성벽 여장 아래 현안을 길게 내어 적이 성벽을 오르려 할 때 끊는 물이나 기름, 오물 등을 흘릴 수 있게 하였고 여장에 원총안 2기와 근총안 1기로 1타(타는 여장의 사이사이의 틈인 타구와 그 타구 사이를 말하며 화성에는 그 타의 수가 무려 918타가 있다)로 만들어 적을 방어하고 문루 위 호로전안을 두어 누 아래 적병을 공격하여 성문을 방어하였다.
화성의 팔달문은 현존하는 성문 중 축조시기가 조선 후기이기는 하나 축성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문으로 화성축성시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이밖에 돈대를 설치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대문 외에 다섯 곳에 암문을 내어 유사시 비밀 출입구로 주민들이나 가축이 통과하고 군량 등을 나르도록 했다.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흐르는 유천(柳川현 수원천) 위에는 각기 북수문과 남수문을 세우고 북수문 위에 화홍문 누각을 올렸으며 그 옆에 조선 후기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방화수류정이 세웠다. 방화수류정 아래로 연못을 파고 용머리 바위를 놓아 용연이라 하였으며 '龍池待月'(용연에서 달 뜨는 것을 기다리는 경치) 이라하여 수원 팔경의 하나이다. 이밖에 방화수류정, 용연, 화홍문은 수원 화성의 백미라 꼽는다.

높은 위치에서 바깥 적의 동정을 살피는 노대를 각기 서쪽과 동쪽에 하나씩 두었고 전쟁시에는 장대를 방어하도록 쇠뇌(석궁)를 발사하였다. 서장대는 군사 지휘 본부로 화성장대라고 불리며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맞아 을묘 원행 때 정조는 화성에서 주간과 야간에 장용외영군을 동원하여 방진 훈련을 친히 지휘했다.

동장대는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연병장 및 지휘본부라 할 수 있으며 연무대라고 불린다. 동장대 뒤쪽, 낮은 담을 큰 돌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식으로 쌓아 올린 문석대위에 둥글게 구운 기와를 연속적으로 이어진 고리무늬의 영롱장은 뛰어난 미적 감각의 맛과 선조들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큰 행사를 자주 치렀는데 대표적으로 호궤 행사였다. 호궤란 주로 군인들 대상으로 음식물을 베푸는 행사로 축성 공사를 하면서 열한 차례에 걸쳐 감독관이나 장인들 및 일꾼들에게 베풀었다하니 정조가 화성에 쏟은 정성을 느낄 수 있다.

바깥을 멀리 감시하는 망루 역할을 하는 세 군데의 공심돈을 만들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성이나 군사 초소와 긴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봉돈도 하나 세웠다. 다섯 개의 연기통을 만들어 연기가 올라가는 숫자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도록 한 통신 시설로 조선의 중앙집권통치체제를 뒷받침하였던 봉수제이다.

그 밖에도 성벽을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치를 여덟 군데, 군사가 몸을 숨길 수 있고 포를 쏘는 포루를 다섯 군데, 성의 서쪽과 동쪽에는 군사를 지휘하는 서장대와 동장대, 성벽 모서리마다 사방을 내다볼 수 있는 누각인 각루도 네 군데 세웠다.
특히, 공심돈은 우리나라 성건축에서 유일한 시설이며 이는 정조가 친히 설계하고 고안한 시설로 축성 후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또한 가운데 옹성이나 공심돈, 봉돈, 포루는 몸체를 모두 벽돌로 쌓았다.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방어에 편리한 구조 설계하는데 용이하게 축성할 수 있었다.

성곽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수원화성의 공사의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화성성역의궤』로 이 책에는 당시 현장의 일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겼으며 성곽의 설계 과정, 실제 지어진 건물의 형태, 규격 특징 등이 요약돼 있고, 공사시 사용한 자재 운반 기구의 상세한 그림, 공사에 종사한 감독관이나 말단 장인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이름과 출신지, 작업한 날짜까지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시 각 성문에 남아있는 공사책임자와 장인을 기록한 성벽과 함께 조선 후기 정조시대 높은 문화적 수준이 근대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수원화성은 1975년부터 약 4년 동안 복원되었고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본래의 모습대로 거의 재현되어 오늘날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화성이 가지는 문화적 우수성은 성밖 주위로 만석거, 축만제, 만년제 라는 저수지를 만들어 둔전을 개간하여 신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성안 대도회를 부흥하여 상공업 발달을 촉진시키며 조선후기 번영을 구가하였으며 단순히 성곽이 가지는 가시적 기능과 효과 뿐, 아니라 화성이 단순 성곽을 넘어서 당대 수원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당대의 화성에 역할이 조선후기 진경문화를 대표하는 그 문화재적 보존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화성 안팎으로 소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심어 화성민의 생활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선후기 화성은 경제도시이자 상업도시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도시(장용외영 설치)로 조선후기 진경문화의 정수를 이뤘다. 18세기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화성 축성 자체에 거중기 고안 및 실명제 등 실용성의 바탕되고 화성이 단순한 성곽을 넘어 농업과 상업이 바탕이 되는 자족적 신도시로 만든 것은 이용후생의 정신을 반영한 당대 사상과 기술이 집약된 문화의 표본이다.
2009. 10. 20. 14:59

















































































'달이샘의 역사나들이(답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성 야경 (6) | 2025.06.26 |
|---|---|
| 수원 화성 (4) | 2025.06.26 |
| 임진각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0) | 2025.06.25 |
| 광명 영회원 (5) | 2025.06.24 |
| 남한산성 행궁 (3) | 2025.06.24 |